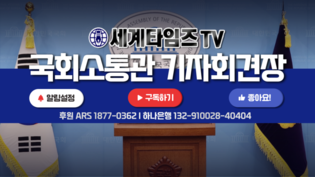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
| ▲ |
이렇듯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4월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완성차업체(현대차·기아·한국GM·KG모빌리티·르노코리아)의 올해 1분기 친환경 차 국내 판매량은 10만 1,727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8.7% 증가한 수준이다. 1분기에 판매된 친환경 차 가운데 84.4%에 해당하는 8만 5,828대가 하이브리드차였다. 지난해 1분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6만 302대와 비교해 42.4% 늘어난 판매량이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가 오는 8월 ‘게임체인저’가 될 자율주행 로보택시 발표를 공언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도 1조 2,88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술 개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 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비관론이 제기된 와중에도 여전히 업계에서는 미래 모빌리티(Movility) 시장을 선도할 핵심기술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아닐 수 없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은 미래 차 시장의 전기차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전기차 굴기(堀起 솟아오름)’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등에 보조금으로 약 1,730억 달러(약 239조 원)를 지출했다. 또한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比亞迪 BYD)는 2018∼2022년 정부로부터 보조금 약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를 받았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郑州)시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연간 70만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춘 ‘신에너지 자동차의 도시’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한 달 후, 정저우의 한 국영 기업이 3,000명에 가까운 직원과 공장을 보유한 ‘하이마’ 자동차의 현지 법인 자산을 인수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현금 약 2,750만 달러를 확보한 ‘하이마(海馬)’는 정저우시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시장에서 수출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며 미래 차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과잉 공급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도 중국 전기차의 생산 능력과 기술을 급속도로 끌어올렸다. 상하이에 근거지를 둔 자동차 전략회사 오토모빌리티 및 중국 승용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0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판매량은 약 2,200만 대에 불과하다. 자국 수요가 공급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이 이렇게 초과 공급된 전기차를 자국 시장에 덤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미국 전기차업체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5월 3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Guidance)를 각각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지난해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 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 과잉 공급을 경계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의 범람에, 서방은 향후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 자국 산업을 지켜낼지 주목된다. 중국 관리들은 줄기차게 “자국 자동차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불공평하며 중국 차는 해외 시장에 혁신적이고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입장을 고집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과연 서방 정책입안자들은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로 여겨진다. 한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선두권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은 한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11대 분야 136개 핵심 과학기술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4.7년에서 3.2년으로 1.5년 좁히는 사이에 중국은 6.6년에서 3.0년으로 3.6년이나 크게 단축하며 한국을 추월했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평가에 소름이 돋는 것을 넘어서서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낀다. ‘주요 5개국’에 대한 평가 결과 각국의 전체 대상 기술 수준과 격차는 2022년 기준으로 1위인 미국의 수준을 100%로 봤을 때 또 기술 격차를 미국을 0.0년으로 봤을 때 미국(수준 100% / 격차 0.0년), EU(수준 94.7% / 격차 0.9년), 일본(86.4% / 2.2년), 중국(82.6% / 3.0년), 한국(81.5% / 3.2년) 순이었다. 중국은 82.6%로 한국의 81.5%보다 1.1%포인트 앞서면서 순위가 뒤집힌 것이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2020년보다 1.4%포인트 향상에 그친데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2.6%포인트 상승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밀리는 치욕(恥辱)을 당한 것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서도 2022년 중국 자율주행차 논문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93.5%로 한국(83.7%), 일본(79.4%)에 앞섰다.
중국 전기차의 높아진 경쟁력은 지난달 열린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에서도 확인됐다. 2년마다 열리는 베이징 모터쇼가 지난 4월 25~26일 이틀 동안의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했고, 올해 4년 만의 행사로 지난 5월 4일까지 행사가 이어졌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동차’를 주제로 한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는 완성차업체와 부품 제조사 등 1,5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80여 완성차업체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 차 278개 모델과 콘셉트카 41종을 전시했다. 4년 전인 2020년 전시된 신에너지 차는 120여 대 정도였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41만 대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에 육박한다. 올해는 약 1,000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샤오미(小米)가 첫 전기차 ‘SU7(중국명 수치)’을 선보였는데 출시되자마자 당일 1분 만에 1만 대가 팔려 화제가 됐고 27분 만에 판매량 5만 대를 돌파한 바 있는데 약 한 달 만에 7만 대 이상의 판매고(販賣高)를 올렸다. 세계 1위 전기차 회사로 올라선 비야디(BYD)도 고출력의 프리미엄 전기 세단 ‘U7’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중국의 샤오미(小米), 화웨이(华为 華爲), 비야디(BYD), 니오(NIO 蔚來), 지커(Zeekr), 훙치(Hongqi 红旗) 등 중국 회사가 주인공이고 글로벌 업체들은 주변부에 포진한 느낌이었다. 중국 전기차의 위세에 놀란 독일 폭스바겐 ‘토마스 셰퍼(Thomas Schafer)’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바겐의) 지붕이 불타고 있다”라고 토로했을 정도라고 한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 미래 차인 하이브리드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미래 차 시장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 차 개발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전기차 등 미래 차 산업 기술 인력은 2028년에 8만 9,069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자동차공학 석·박사 졸업생 수는 한 해 평균 200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KIAT는 “다른 전공자까지 포함하더라도 부족 인력은 매년 2,000명 이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 차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전문 인재 양성 및 해외 고급 두뇌를 유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역량을 결집 총력전을 펼쳐야 함은 당연하다. 기업들은 인재·기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서두르고 정부는 예산·세제 등으로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국가대항의 치열한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미래 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