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
1906년 월남 이상재선생이 구국의 일환으로 100명 장사 양성을 하고자 강도관 유도가 유입되기 이전 이미 나수영선생은 조선의 고류유술가였다. 고종황제 시기에 무관출신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고류유술 및 강도관 유도를 전수받고 왔다는 기록이 1906년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아마도 이 시기에 고종황제는 월남 이상재선생에게 구국의 일환으로 100명 장사 양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1901년~1903년 강도관 유도에 입문한 조선무관출신들이 총 8명(1901년에 신순성⋅전영헌⋅김익상 등 3인이, 1902년 송재관⋅유동건⋅한규복의 3인이, 1903년에 유동수⋅나금전) 존재하기에 나수영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는 이전이라 생각되며 이후 일본 강도관 유도가 유입된다. 그는 김홍식선생과 일본 사람을 지도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또 사진이 보이는데 이는 모든 과정을 전수받았다는 증거이다.
특히 유근수선생과 나수영선생은 고종 시기에 무관학교출신이었다는 것은 이미 한국적인 옛 고류유술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본격적으로 조선의 고류유술은 1909년 나수영선생과 류근수 선생을 사범에서 시작된다. 조선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처음으로 도장을 개설했는데 26년간 입문자 총수는 90여명에 달했다(東亞日報 1934년 3월 3일자).
그렇다면 나수영의 고류유술인 천풍해세류(天風海勢流)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나수영 선생의 고류유술은 「天風海勢流」였다. 그리하여 YMCA 유술부에서 최초의 유단자 김홍식 선생에게 준 유도초단증서(柔道初段證書)를 보면 “貴人이 좌의 천풍해세류 체술 각과를 전수 얏기 자에 초단을 증여”함으로 되어 있다.
김홍식 선생이 살아생전 언급하기를 원래 유도는 일본의 유술이 아니라 본래 신라에서 나서 일본으로 유입되어 있으며 이 기록은 나수영선생이 전수받아온 일본 고전유술 전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전서의 기록은 일본 각종 옛 유술 전서와 유물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 전서에 의하면 구전으로 된 세 가지 비법과 아홉 가지의 살법(殺法)과 여섯 가지의 활법(活法)을 쓸 줄 알게 되면, 「天風海勢流」를 터득했다고 해서 그에게 초단증을 증여하게 된다.
그는 이 초단증을 받은 내제자로서는 김상익, 박재영, 호기풍, 김홍식, 이인만 등이다. 내제자 박재영이 전승해 받았지만 그가 일제강점기 시절 스승 나수영 선생을 만나 신흥무관학교 교관 및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망명하는 도중 객사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자료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조선의 근대 고류유술의 발자취 및 고류유술의 기원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이 더욱 확고히 될 것이다.
 |
| ▲1910년 YMCA 유술지도자는 나수영 선생이며 이 사진은 왼쪽이 김홍식, 가운데가 나수영, 신원미상 일본인이 지도 받았다는 것은 조선의 최고 고류유술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다. |
특히 최초의 YMCA 유술사범 사범은 유근수였으며 이후에 나수영으로 교체된다(李濟晃(1976), 신유도, 서울 : 수상사, p.22., 李學來(1990), 韓國柔道發達史, 서울). 이제황 선생은, 즉 강도관 유도가 최초의 YMCA 한국 도입설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강도관의 유도가 한국에 도입되기 이전에 고류유술이 조선에 있었다. 1914년도 체육부 보고서에서의 유술이라는 명칭, 그리고 나수영의 제자인 김홍식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전택부(전택부(1993),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서울 : 종로서적)의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유술부와 유도의 기록 사적자료이다.
 |
| ▲1909년 나수영 선생이 발급한 조선유술부 천풍해세류(天風海勢流) 체술 증서 황성기독교 청년회 김홍식 초전(단) 수여 |
 |
| ▲1928년 고류유술의 천풍해세류 관련된 신문기사 |
 |
| ▲1928년 고류유술 천신진양류 관련된 신문기사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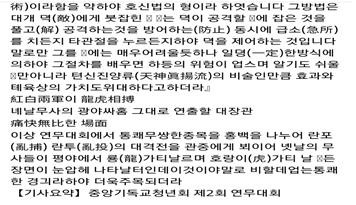 |
| ▲1928년 고류유술 천신진양류 관련된 신문기사 2 |
이처럼 고류유술인 천풍해세류 및 천신진양류와 강도관 유도 융합하여 하나로 된 조선유술부, 조선유도연맹이며 대한유도학교의 매개체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는 1928년도 위 신문기사이다. 즉 조선유술부 또는 조선유도연맹에서 소공동 대한유도학교로 전승되었던 것이다.
조선유술부는 강도관 조선지부로 강제로 편입되지만 강도관 유도의 원형인 나수영 선생이 일본에서 고류유술의 천신진양류를 전수받은 것을 제자 장권 사범이 지도하고 있었다. 이를 우리 고유적 고류유술과 결합시켜 1909년 천풍해세류이라고 했는데 YMCA 유술부 지도자 나수영 선생이었다. 이를 전승한 인물이 장권 사범이고 그 후예들은 일본 강도관 유도를 석권했었는데 이선길 선생이다. 그는 일본 강도관 유도 1930년~1940년대까지 석권했던 인물이다. 그는 해방 이후 근대 무도의 본 고장 대구에 내려가 후진양성을 한다. 그다음 후예들은 이제황선생과 석진경 선생(일본학생대회 석권) 및 한진희 선생 그리고 박정준 선생(제8회 전일본선수권대회 석권) 등이다.
옛 선조들에 의해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에서 전승되었기에 고무적인 일이며 강도관 유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뿐만 그 우수성이 더 높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고류유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다. 제일 먼저 유도하면 일본 강도관 유도를 생각하듯이 옛 유술하면 대한민국의 고류유술을 제일 으뜸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무도인들이 전통과 정통의 고류유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제도화시켜야할 역사적 사명감이 필요한 현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무형유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화와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고류유술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